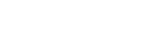[프레스나인]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세운 주주 친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장기 투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들의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필수라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분기배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본이 됐다. 미국 S&P500 기업 중 80% 이상이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분기배당은 이미 ‘기본 옵션’이 된 지 오래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모두 분기배당을 도입해, 매 분기 성과에 따라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고 있다. 이는 실적 기반의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장기 보유 유인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여전히 동참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동시에 명백한 상장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기배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구호와 명백히 모순된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 ‘상징적인 선두주자’로 나서야 할 기업이 정작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더구나 기업은행은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본력도 충분하다. 그런데 배당성향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다른 금융지주들이 50%에 육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마저도 연 1회 지급하는 후진적인 배당 방식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유연한 자산 운용 기회도 놓치게 된다.
정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인 국책은행에서부터 그 기준을 실현해야 한다. 기업은행이 분기배당을 도입하지 않는 한, 정부는 주주친화 기조를 따르지 않는 민간 기업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민간 금융지주보다도 후퇴한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주주 가치 제고’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는가?
기업은행의 분기배당 도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다.